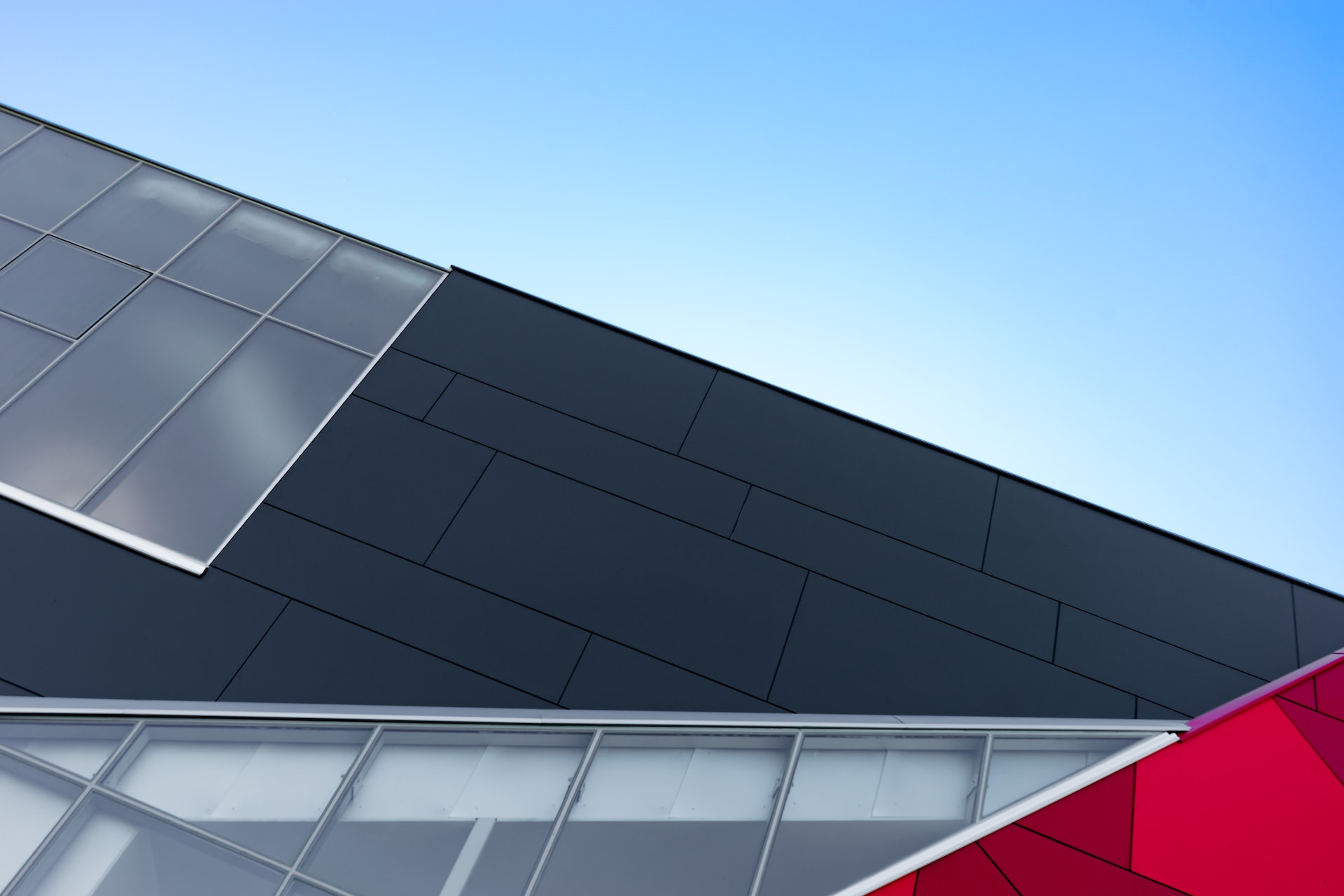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나곤 합니다.
작게는 회사의 지침을 어겨 회사에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부터, 수십억원의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수 있을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금 채권은 별개
우선, 아무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직원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근로자가 회사에 가지는 퇴직금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므로, 이는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와는 별개의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은 상계처리가 가능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간 상계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횡령한 근로자와 퇴직금 상계동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275 판결).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상계동의서를 받으신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아직 상계가부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DB형 퇴직연금 상계 가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계가 제한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퇴사이후의 근로자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
그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본소), 2018다25502(반소) 판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이후 근로자로부터 퇴직연금 청구권 불행사 동의서 와 같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신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