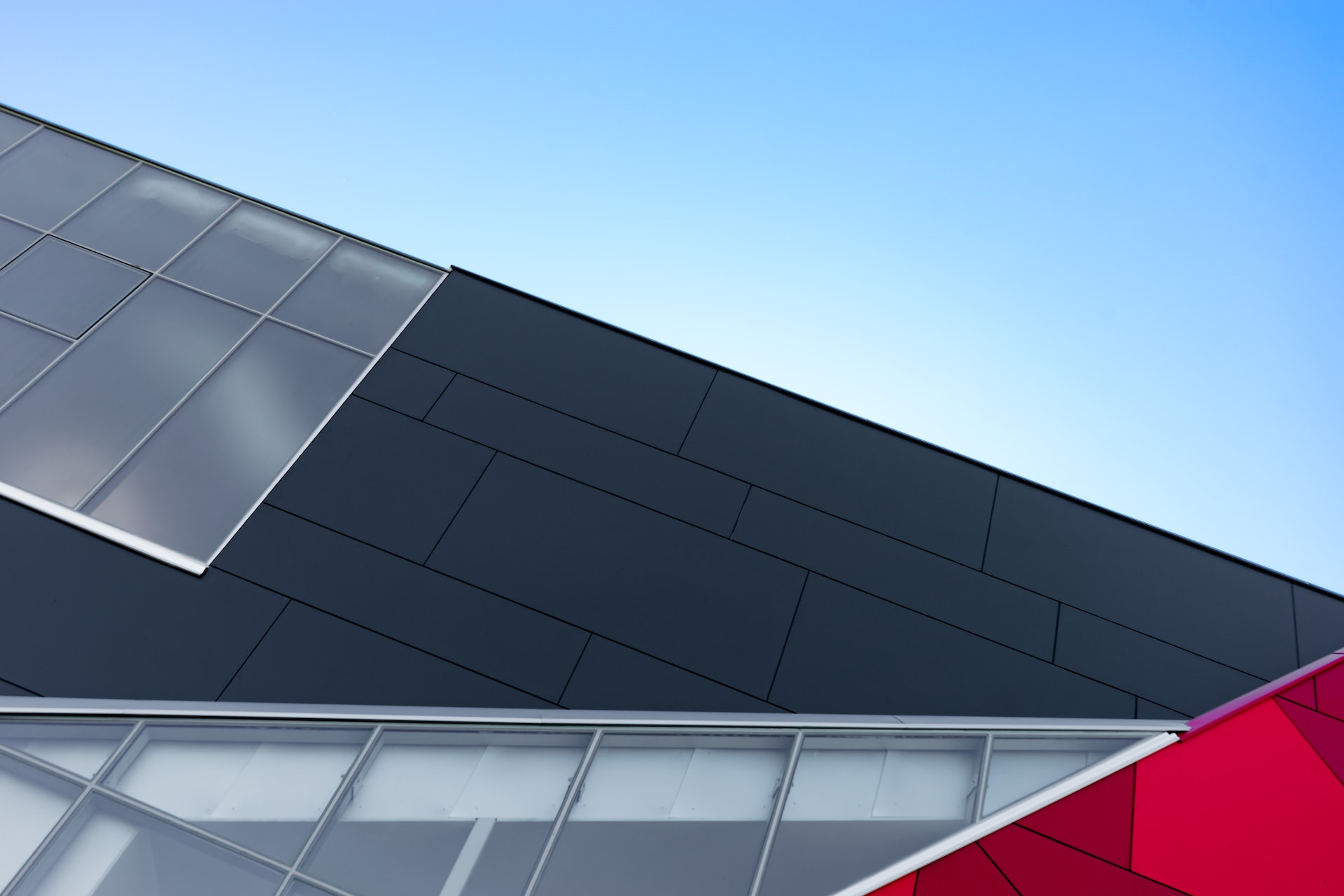1. 캐릭터는 매체 또는 작품과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캐릭터에 대하여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각 참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하급심에서는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으로서 그 외모, 행동, 성격이나 위 대중매체들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내용 등에 의하여 독창적인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5. 25. 선고 2000가합7289 판결 참조)”으로서 성격과 같은 아이덴티티 자체를 캐릭터로 정의내리기도 하며,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포함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서울고등법원 1999. 12. 21. 선고 99나23521 판결 참조)” 또는 “캐릭터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부여한 특수한 성격을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경제적 가치를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캐릭터란 일반적으로 만화, 텔레비전, 영화, 소설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 특징, 성격, 명칭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 신야구 게임 사건(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원고는 ‘실황야구’라는 제호의 야구 게임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신야구’라는 제호의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신야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제작 및 제공함으로써 ‘실황야구’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황야구’라는 저작물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실황야구’와 같은 저작물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 플롯(plot), 게임의 전개, 다양한 선택, 도구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원고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대비목록 중 ‘실황야구’ 캐릭터는 이 사건 ‘실황야구’라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 즉, 캐릭터란 그 개개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실황야구’ 캐릭터가 등장하는 ‘실황야구’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위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위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캐릭터라 함은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는 전제에서, 위 ‘실황야구’ 캐릭터가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상품화 정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 판결 참조).
요컨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캐릭터라는 것은 형상과 명칭으로서 표현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창작자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인 매체나 작품과 별개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고객흡인력이 있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