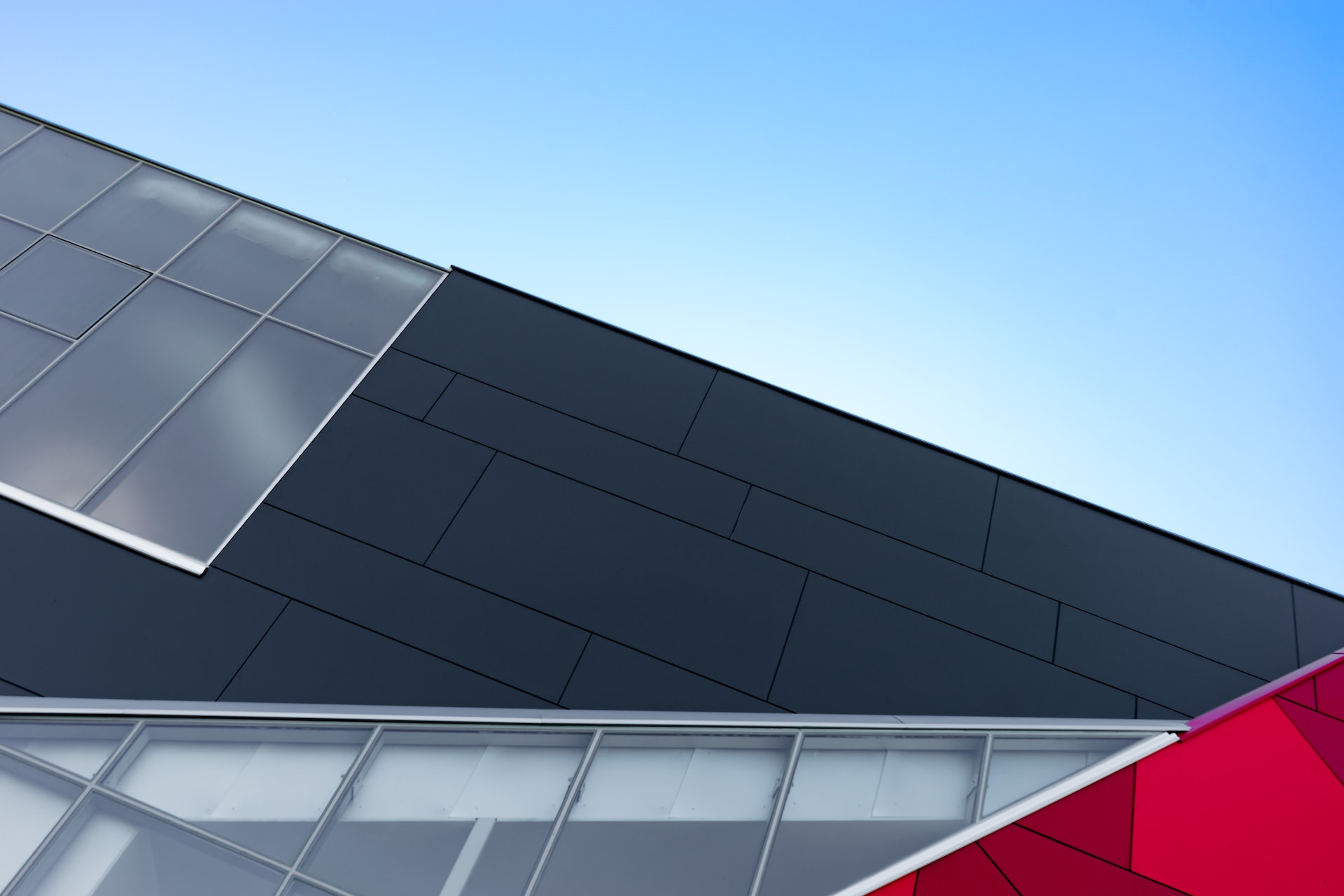벤처기업법 RSU 시행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하겠습니다)이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제16조의17 내지 제16조의 19를 신설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란,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4~5년 전부터 스타트업 업계에서 논의가 활발하였던 RSU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벤처기업법 상 성과조건부주식’ 과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계약, 교부하는 자기주식 교부 계약까지 통칭하여 RSU(Restricted Stock Units)라 하겠습니다.
RSU는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입니다. 2003년 MS가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주식회사 한화가 도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는 현재 재직 6개월이 지난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 10년 뒤 약속한 주식의 절반과 환가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상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한화는 어떻게 4년전부터 RSU를 부여하고 있는 것 일까요?
상법 상 RSU와 차이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을 통해 부여하는 RSU와 벤처기업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법상으로 부여하는 RSU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벤처기법법 상 RSU의 핵심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법 제16조의18) 입니다.
기존방식의 RSU 부여는 상법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배당가능이익 한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제 벤처기업법상의 RSU 부여는 특례를 사용하면 자기주식을 좀 더 폭넓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법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하려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의 금액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상 자기주식취득 특례를 사용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자본금 한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만약, RSU 부여에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면 굳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RSU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RSU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먼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직원 보상제도중 하나인, 스톡옵션과 RSU의 비교를 통해 RSU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