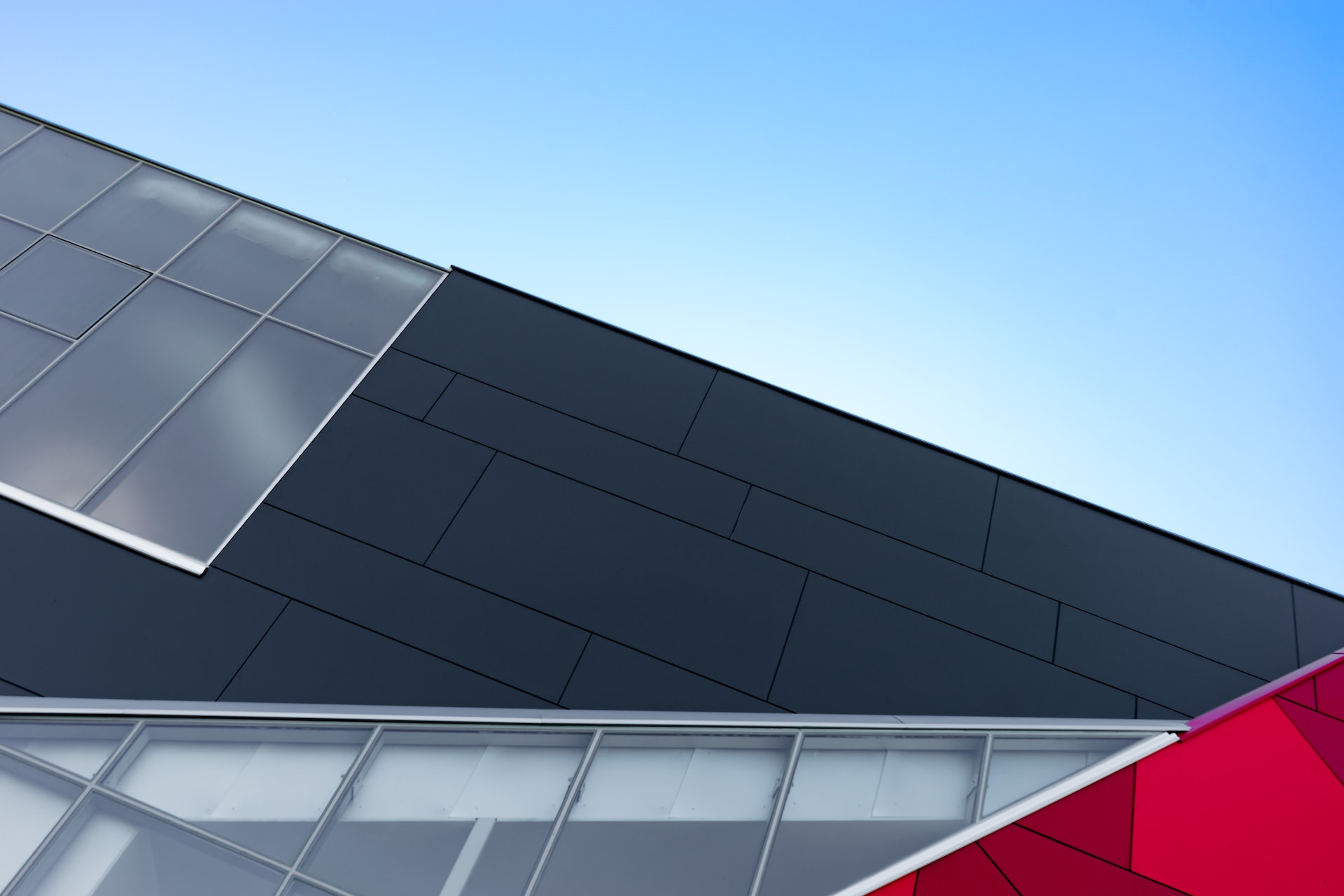근로자의 법적 정의
노동청에서 접수되는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합니다) 입니다. 전자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이해되고, 후자인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이해됩니다. 노동법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가 다른 것, 알고 계셨습니까? 즉, 누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양 법의 근로자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법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이를 보면,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 등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로 조금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
이 두 차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아래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1)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2) 종속노동성
3) 독립사업자성
4) 보수의 근로대가성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아래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최근 학습지 교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 방송연기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매점운영자(대법원 2019. 2. 25. 선고 2016두41361 판결), 자동차판매원(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지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중,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지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내용이 위탁사업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한정되며,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는 부정하였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판단 기준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판단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은 직업, 같은 사안에서도 양 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사건 중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각 법 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하종석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