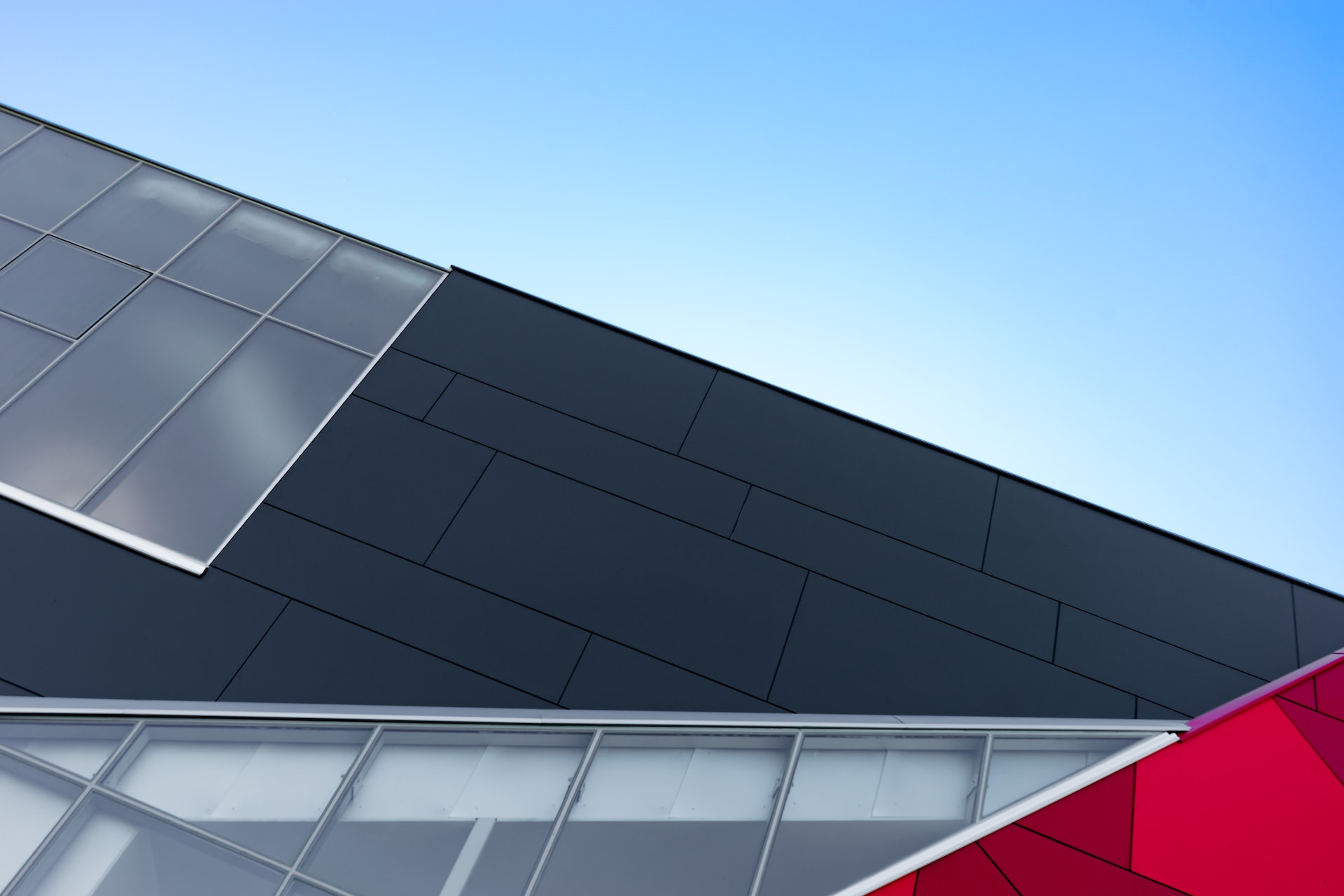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여보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OOO입니다”
느닷없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씩은 다들 받아봤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검찰청이라는 말에 덜컥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싱범들에 대해 피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싱범들은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은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조의4), 나아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의5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 06. 위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각 금융기관에 하달하였는데, 이상금융거래의 예시로서 ‘동일 단말에서 단시간 동안 다수의 계정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이상금융거래의 핵심 징표를 ❶ 동일 단말, ❷ 단시간, ❸ 다수의 계정으로 분산이체로 구체화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본다면, 피싱범에게 속아 하나의 계좌로만 피해금을 여러 차례 입금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피해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 기관 소속임을 내세우면서 특정 계좌로의 이체나 개인정보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전화를 바로 끊거나, 혹은 기관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전화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