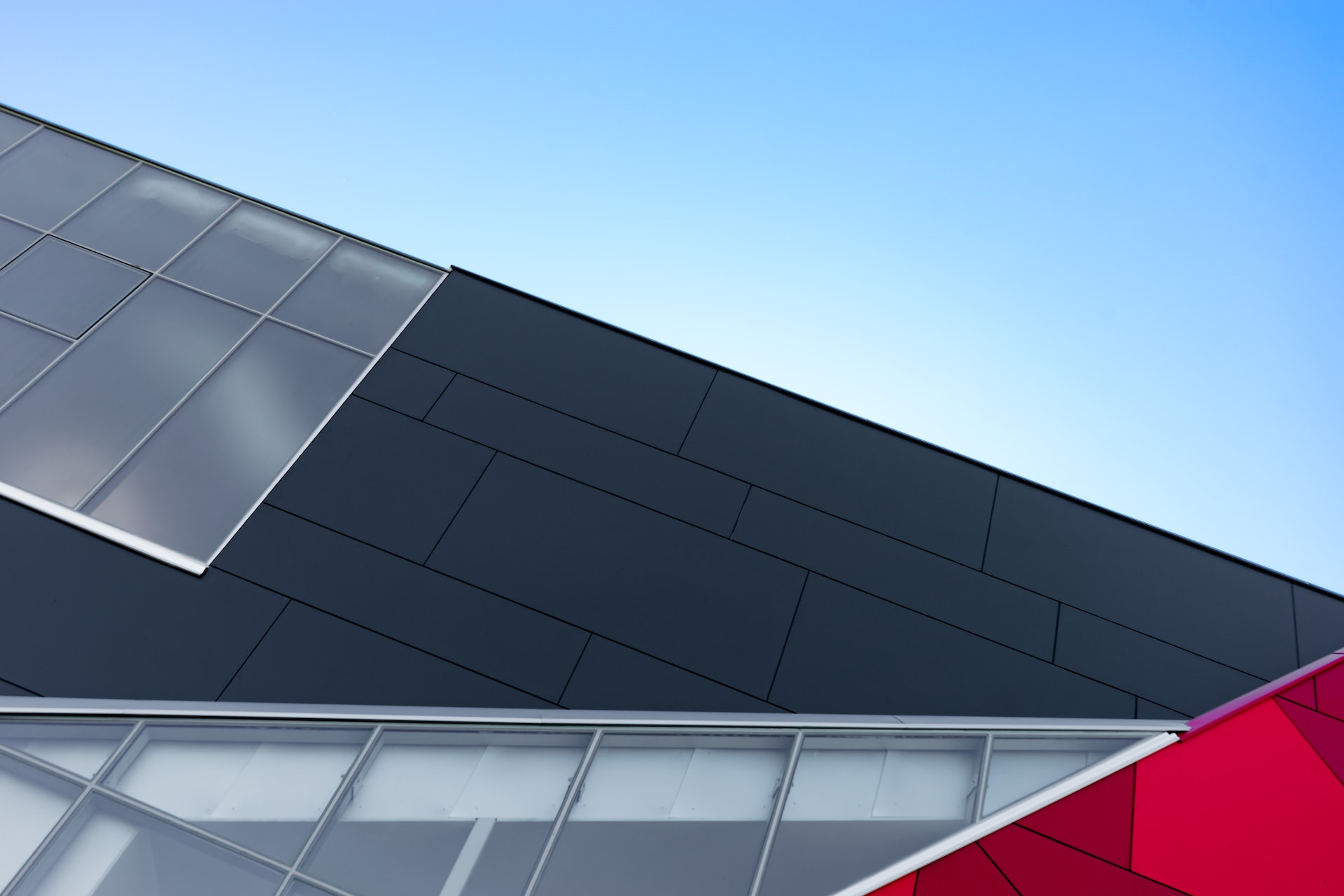1.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침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참조).
2. 노래방 기기 재생과 공연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례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논지에서 판례는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참조).
3. 노래방기기 제작의 허락과 공연의 허락
또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참조).
4. 영상제작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그러나 판례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고 한정되게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조).끝.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4 DKL Partners.